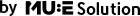변관식(卞寬植, 1899~1976)
<춘경산수>, 1952, 종이에 수묵채색, 36.5×113.2cm, 전북도립미술관 소장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처럼 그린 진주 풍광은 변관식의 이 지역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명승지를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의 이치를 알아나갔지만,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쟁이 화가였다. 서울의 태화관에서 열린 화가들의 모임에서 기생을 농락하던 일본인 총독부 고위 관료를 혼쭐을 내주면서 식탁을 엎어버린 일은 일제강점기 내내 그의 운신을 어렵게 만든 사건이었다. 먹을 쌓아 올리는 적묵법으로 그려 거칠어 보이는 금강산 그림은 예전에는 크게 이해받지 못했다. 그는 금강산을 많이 그렸고 진주를 그린 것도 많다. 전쟁기에 그려진 이 작품은 그가 만난 한국의 땅에 대해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할멈은 이따금 내 그림을 보고 있다가 ‘당신 그림은 모두 금강이오’ 하건만 나는 정녕 금강 그것만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정릉 골짜기를 흘러가는 물도 사랑스럽고 인수봉의 밋밋한 맨얼굴도 오히려 어여쁘다. 이 나라 삼천리에 금강 아닌 곳이 어디며, 일만 강줄기 그 모두가 금강에서 비롯하지 않음이 없지 않으냐? 먹을 갈아 놓고 내 늙은 눈을 감는다. 붓끝에 와닿는 먹의 감촉이 가볍고 서늘하니 내 마음 또한 그윽이 쾌적하다. ‘이번에 당신 그림은 무어요?’ 우리 할멈이 물어오면 나는 그저 ‘금강이네’라고만 답할 뿐이다.”